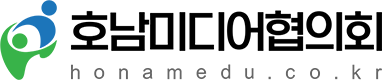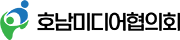|
‘수요응답형 교통체계’란 기존의 대중교통과 달리 승객의 호출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, 광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주요 교통 거점과 관광지를 오가는 수요응답형 버스 ‘광주DRT’를 시범 운행했다.
양 의원은 “‘광주DRT’는 5개월간 총 3,300여 명이 탑승하여 일평균 약 22명, 시간당 1.5명 이용에 그쳤다”며 “수요응답형 버스는 사실상 광주 내 교통 벽오지인 광산구 농촌지역에서 운행돼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그러면서 “광산구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하고 1인당 월 2매씩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나, 이는 교통 소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”며 “지속적인 인력, 비용이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이에 대해 “농촌지역 내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에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”며 “전남 영암군은 지난해 3월 노선버스를 수요응답형 콜버스로 전환하면서 대기시간이 34분 단축됐고, 노선버스의 연간 운영비를 5억 2천여만 원 절감했다”고 설명했다.
또한 “경기도는 2년 전 안산시에서 6대로 시작해 현재 16개 시군에서 226대를 운행할 만큼 이용객이 크게 늘어 올해 80대를 더 늘일 계획이다”며 “일본에서도 노년층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아 큰 인기를 끌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양 의원은 “인간의 기본권인 이동권의 차별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교통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”고 강조하며 농촌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을 적극 요청했다.
추성길 기자
 2025.05.10 (토) 02:39
2025.05.10 (토) 02:39